무오사화와 사관 김일손 - 28회 실록청 당상 이극돈, 상소하다(2)
- 기자명 푸드n라이프
- 입력 2025.05.12 19:33
- 댓글 0
실록청 당상 이극돈(1435∼1503)의 상소는 이어진다.
“그 후에 신이 노사신의 집에 갔더니, 노사신이 신에게 말했습니다.
노사신 : ‘사관(史官)이 세조 조의 궁금(宮禁)에 대한 일을 쓴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가?’
이극돈 : ‘나도 역시 김일손의 사초에 씌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내가 공과 더불어 날마다 근밀한 곳에 있었으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먼저 들었을 것인데, 김일손(1464∽1498)은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 어디에서 세조 조의 일을 들었단 말인가?’
노사신 :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이후 서로 더불어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노사신(1427~1498)은 조부가 좌의정 노한이고, 부친은 동지돈녕부사 노물재이다. 1453년에 급제하여 곧 집현전 박사에 선임되었고, 1462년에 세조의 총애로 세자좌문학에서 5자급(資級)을 뛰어넘어 동부승지에 제수되었다.
1463년에는 도승지, 1465년에는 호조판서가 되어 최항과 함께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을 총괄하였다. 1468년에는 남이·강순 등의 역모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 3등에 올라 선성군에 봉해졌다. 1469년에 의정부 우참찬·좌참찬을 거쳐 우찬성에 올랐고, 1470년(성종 1)에 의정부 좌찬성에 올랐다. 1492년에 좌의정, 1495년에 영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문과독권관(文科讀卷官)이었을 때 처족을 합격시켰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영의정을 사직하였다. 1498년 무오사화 때 윤필상·유자광 등이 김일손 등 사림파를 제거하는 논의를 주동하자, 세조의 총신이어서 미온적으로나마 동조하였다.
이극돈의 상소문을 계속 읽어보자.
“그 후에 한치형이 그에 대해 처치할 일을 문의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실록』에는 실릴 리는 만무하지만, 그 원본 사초(史草)는 으레 춘추관(春秋館)에 수장되어 만세에 전하는데, 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무릇 사초는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만약 계달(啓達)하지 아니하면 버릴 수가 없으므로 본청에서 함께 의논한 후에 계달할 것을 이미 의정(議定)했다.’고 하니, 한치형도 ‘매우 가한 처사이니, 빨리 함께 의논해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에 노사신이 신에게 ‘전일의 일은 어떻게 낙착을 지었는가?’고 물으므로, 신은 한치형에게 한 말을 그대로 말했더니, 노사신은 ‘나와 그대는 세조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얕지 아니하니, 다른 사람이 만약 아뢰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아뢰어야한다.’고 말하기에, 신이 ‘함께 의논하는 날에는 누가 감히 아뢰는 것을 불가하다하겠는가.’라고 대답하니, 노사신은 ‘마땅히 공의(共議)를 기다려서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에 한치형이 또 신에게 ‘이 일을 공의(共議)했느냐?’고 물으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신해년(성종 22년 : 1491년)이 겨우 5년 되었으니, 만약 2, 3일 동안만 공의를 한다면 이 해의 것을 의논할 수 있네. 다만 당해년 사초를 가까운 시일 내로 마땅히 인출해야 하는데 정서(正書)한 곳에 착오가 많기 때문에 다시 교정하느라 겨를이 없어서 미처 의논을 마치지 못했다.’ 하니, 한치형이 말하기를 ‘공의한 뒤에는 나에게 말해야 한다.’ 하므로, 신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극돈이 한치형, 노사신과 주고받은 대화는 아마도 1498년 무오사화 이전의 일이었다. 이를 보면 이극돈은 김일손의 사초를 공의(共議)하지 못했다.
상소는 이어진다.
“지난 7월 5일 조참(朝參) 후에 한치형이 신에게 말하기를 ‘전자에 의논한 일을 충훈부(忠勳府)에서 아뢰려고 하는데, 당초에 그대와 공의하였으니 함께 계하는 것이 옳겠다.’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충훈부도 똑같은 세조의 신하이니, 공공연하게 계달하는 것이 매우 좋다. 다만 당초에 실록청의 당상과 공의한 뒤에 아뢰기로 의정했는데, 지금 만약 내가 홀로 충훈부와 아뢴다면 본청(실록청)에서 나를 반복한다고 할 것이다. 충훈부에서 아뢰었으면 반드시 하문하셨을 것이므로 이미 그 사초를 봉해서 실대(實對)를 했을 것이다.’ 하였더니, 한치형은 말하기를, ‘과연 그렇겠다.’ 하였지만, 오늘 곧 아뢴다는 뜻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은 물러나 실록청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안 되어 의금부 서리가 와서 신에게 고하기를, ‘부(府)의 낭청(郞廳) 두 사람이 외방으로 향해 떠났다.’ 하므로, 신은 가만히 유순에게 말하기를 ‘나는 들은 바가 있다. 반드시 충훈부에서 아뢰었을 것이다. 우리들이 그 시초의 일을 보지 못했는데, 만약 하문하시면 신들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답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니, 유순은 대답하기를, ‘당연히 여러 사람과 함께 보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연산군이 의금부 낭청 두 사람을 경상도로 보낸 것은 1498년 7월 1일 이었다. 1498년 7월 1일 자 『연산군일기』에 의하면 비사(秘事)를 아뢴 사람은 파평 부원군 윤필상, 선성 부원군 노사신, 우의정 한치형, 무령군 유자광이었고, 의금부 경력(經歷) 홍사호와 도사(都事) 신극성이 연산군의 명령을 받들고 경상도로 달려갔는데, 외부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다. 연산군이 극비에 붙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극돈은 윤필상등이 연산군에게 비사를 아뢴 4일 후인 7월 5일에야 사초와 관련하여 사건이 터진 것을 알았다.
상소는 계속된다.
“7월 8일에 낭청(郞廳)을 보내어 어세겸을 청하고, 또 각방 당상(堂上)에게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와서 회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9일에 어세겸 이하가 모두 와서 모이므로 함께 보고, 무릇 국가의 일에 관계된 것은 모두 부표하여 봉해 두었다가 7월 16일에 입계하였습니다.
대개 일의 시말(始末)이 이러하온데 7월 14일에, 9일에 열어본 이유를 추문(推問)하므로 신은 진술하려 하였으나 국가의 비사(秘事)를 공청(公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만 의금부에서 와서 고(告)한 사유만 납초(納招)하였는데, 지금 신더러 ‘장차 고초를 겪을 것을 알고 그랬다.’고 하교하시니, 감히 모두를 진달하는 것이옵니다.
신이 실지로 노사신·한치형과 함께 아뢰기를 의논하였는데, 또 무엇이 의구(疑懼)스러워서 장차 고초를 겪을 것을 염려하였겠습니까.
또 하교하시기를, ‘9일에 사초(史草)를 보고도 아뢰지 않았으니 늑장 부린 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신은 이미 충훈부에서 아뢴 바 있습니다.
설사 신이 9일에 아뢰었을지라도 전하께서 만약 물으시기를 ‘다른 사람이 아뢰었는데 이제야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신다면, 신 등은 장차 무슨 말로써 대하오리까. 그렇다면 인신(人臣)으로 속인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어 그 죄가 늦게 보고한 죄보다 중하옵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 하문하실 적에, 신이 근밀(近密)의 곳에 처하여 승지를 선후(先後)하여 출입한 것을 들어 말한 것은, 감히 스스로 충성심이 있다고 이른 것이 아니라, 다만 ‘근밀한 곳에 있는 신들도 듣지 못한 일을 김일손이 썼으니 허망(虛妄)하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유순도 역시 말하기를 ‘그 때에 신이 비록 지위 낮은 신하이었지만, 역시 주서(注書)로서 가까이 모셨다.’하였고, 윤효손도 ‘신이 나이가 늙어서 세조 조에 벼슬한 것으로 따지면 신 같이 오래한 자가 없다.’ 하였으니, 모두가 김일손의 허망한 것을 말한 것이온데, 하교하시기를 ‘겉으로는 충신 같으나 속에는 실상 다른 점이 있다.’ 하시니, 신은 명을 들은 이후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옵니다.”
이처럼 이극돈은 연산군의 문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변명을 하였다.
상소는 이어진다.
“또 이목(李穆)이 필시 김일손과 서로 통하여 신을 무함(誣陷)할 생각에서 ‘자기 과실을 쓴 것을 가지고 말을 삼는다.’라고 하지만, 만약 김일손이 쓴 것이 옳다면 신이 마땅히 달게 받아야 하겠지만, 망령된다는 것을 뭇사람이 다 아는 바인데 신이 무엇을 근심하오리까.
또 입초(入草)한 낭청(郞廳)이 있고 초초(初草)를 쓴 낭청이 있고, 중초(中草)를 쓴 낭청이 있고 정초(正草)를 쓴 낭청이 있고, 공의(共議)한 여러 낭청이 있사온데 여러 사람의 눈을 어찌 가릴 수 있으리까.
신은 매양 낭청에게 말하기를, ‘본청의 당상이니 당청에 대한 잘못을 쓴 것이라면 비록 문자(文字)가 졸렬할지라도 한 자라도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으니, 도청(都廳)과 낭청이 누구인들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목은, 신이 김일손의 사초를 봉하니, 장차 일이 발로할 것이라 여겨 신을 무함하고자 하여 두 번이나 임희재와 서한을 통하였고, 임희재는 심지어 신을 장돈(章惇)에게 비하고 신의 자식 세전(世詮)까지 싸잡아서 이목과 서신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소신(小臣)을 모함하여 반드시 사지(死地)에 몰아넣으려고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옵니다.
이것은 국가 대사에 관계되는 바가 아니온 즉 번거롭게 주달할 것이 아니오나, 신이 만약 아뢰지 않는다면 전하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물며 붕당(朋黨)하여 사람을 모함하는 것 역시 사체에 관계되므로 신은 청하여 진술하옵니다.”
(연산군일기 1498년 7월 19일 2번째 기사)
임희재의 공초는 1498년 7월 14일자 『연산군일기』에 나온다.
“임희재는 공초하기를, ‘신이 이목에게 보낸 서한에 ‘이 세상의 허다한 일들을 구경하고 있다.’ 한 것은, 신의 편지 가운데 기재된 일을 지적한 것이요, ‘들으니 그대가 장돈(章惇)의 아들 장전(章銓)을 잘못 건드려 성내게 했다.’는 것은, 목(穆)이 일찍이 이극돈을 가리켜 소인이라 하여 장돈에게 비하였는데, 하루는 목(穆)이 이세전(李世銓)을 만나서 ‘이자가 바로 극돈의 아들인가?’ 말하니, 이세전이 크게 노한 까닭이오며 (후략)”
이를 보면 이극돈을 장돈에 비한 사람은 임희재가 아니라 이목이었다.
이처럼 이극돈의 진술에는 틀린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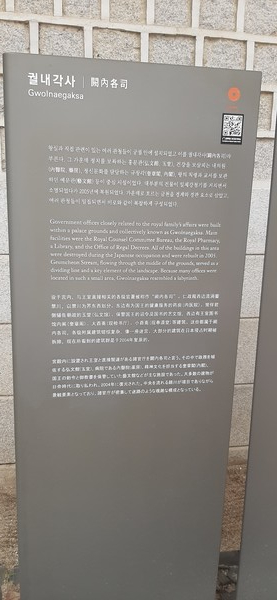
<김세곤 역사 칼럼니스트/청렴연수원 등록 청렴 전문 강사>

▲ 1953년생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석사), 영국 워릭대 대학원 노사관계학과(석사) 졸업
▲ 1983년 행정고등고시(27회) 합격
▲ 1986년부터 고용노동부 근무
▲ 2011년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고위공무원)으로 퇴직
▲ 2011.9-2013.6 한국폴리텍 대학 강릉 캠퍼스 학장 역임
▲ 저서로는 <대한제국망국사 (2023년)> <거북선을 만든 과학자 나대용 장군 평전 (2023년 비매품)> <아우슈비츠 여행(2017년)>, <부패에서 청렴으로(2016년)>,<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 <임진왜란과 호남사람들 2>·<정유재란과 호남사람들>, <임진왜란과 장성 남문의병>, <호남정신의 뿌리를 찾아서- 義의 길을 가다>, <퇴계와 고봉, 소통하다>, <도학과 절의의 선비, 의병장 죽천 박광전>, <청백리 박수량>, <청백리 송흠>, <송강문학기행 - 전남 담양>, <남도문화의 향기에 취하여>, <국화처럼 향기롭게> 등 다수.
관련기사
'김일손의 후손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오사화와 사관 김일손 - 32회 김일손의 행적에 관한 정여창·홍한 · 표연말의 공초 (2) | 2025.06.30 |
|---|---|
| 무오사화와 사관 김일손 - 30회 실록청 당상 이극돈의 상소(4) (7) | 2025.06.11 |
| 무오사화와 사관 김일손 - 28회 실록청 당상 이극돈, 상소하다(2) (0) | 2025.05.13 |
| 무오사화와 사관 김일손-26회 유자광, 김종직 시를 읽은 제자들을 국문하길 청하다. (0) | 2025.05.06 |
| 무오사화와 사관 김일손 - 27회 실록청 당상 이극돈이 상소하다 (0) | 2025.05.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