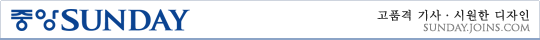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국민이 행복한 선진국 上 덴마크] 안데르센 동화 같은 신뢰의 선순환
특권ㆍ부패ㆍ반칙 안통해…소득 절반 세금 내면서도 97%가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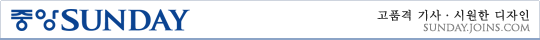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선뜻 대답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응답자 거의 대부분이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입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집행이사회가 여론조사기관인 TNS에 의뢰해 27개 회원국 국민 2만67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올 2월 ‘유럽의 사회현실’(유로바로미터)이란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덴마크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주 행복하다”고 대답한 사람도 49%나 됩니다. 유럽에서 단연 1위입니다.

‘행복한 대니시(Danishㆍ덴마크인)’의 신화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부설 ‘유럽사회조사(ESS)팀’이 올 4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행복지수 1위는 덴마크로, 10점 만점에 8.3점을 기록했습니다. 핀란드(8.06)와 아일랜드(7.96)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나 영국 라이체스터대가 전 세계를 상대로 실시한 행복도 조사에서도 1위는 덴마크였습니다.
덴마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만7000달러로 한국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다고 국민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라이체스터대의 행복도 조사에서 미국은 23위였고, 일본은 90위였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 중 경제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
|
평범한 덴마크인 프레디 메이어(49)씨. |
|
|
| 지중해의 황홀한 햇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 불고 우중충하고 으슬으슬한 날이 많으니 기후가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부존자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소득의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간단히 혼자 점심 한 끼를 때우는 데도 우리 돈으로 2만5000원 정도가 들 정도로 물가는 살인적입니다. 그런데도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안데르센의 동화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제 앞에는 평범한 덴마크인 프레디 메이어(49·사진)씨가 앉아 있습니다. 수도 코펜하겐 교외에 있는 그의 집 거실입니다. 덴마크인과 결혼해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 한 분께 섭외를 부탁했더니 바로 자기 옆집 아저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메이어씨입니다. 그는 자신있게 “너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부인,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17), 중학생 아들(13) 등 4인 가족의 가장인 그는 지극히 평범한 보통 덴마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교육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그의 연봉은 60만 크로네(약 9900만원)쯤 된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35만 크로네가 남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노후연금과 별도로 가입한 개인연금의 보험료와 휴가여행 경비로 떼어놓는 돈을 빼고 나면 저축할 여유는 없습니다. “세금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하이 택스(high tax), 하이 리턴(high return)”이라며 “전혀 불만이 없다”고 말합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 덴마크 식 사회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高)세율’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덴마크는 작은 나라예요. 서로 돕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뒤처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내 어깨에 매달려. 같이 가줄게.’ 이게 바로 덴마크 사회예요. ‘행복한 대니시’의 비밀이지요.”
메이어씨의 행복론은 자녀 교육 문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친이 늘 물어보신 게 있어요. ‘너 오늘 밖에 나가 친구들과 잘 놀았느냐’는 거였어요. ‘못 놀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놀고 들어와라’고 하셨어요. 그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는 아이들이 무조건 공부 잘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남들과 어울려 잘 지낼 수 있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메이어씨는 “나는 아이들의 학교 성적표를 보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소방수가 되든, 제빵 기술자가 되든, 요리사가 되든 그 선택은 아이들 몫이지 나는 전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저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이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덴마크의 대학 진학률은 38%에 불과합니다. 공부에 정말로 취미와 자질이 있는 아이들만 대학에 가고, 나머지 아이들은 각자 소질과 취향에 따라 전문 직업교육을 받습니다. 베르트겔 하더 교육장관은 “기업들과 연계된 덴마크 직업교육 시스템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대학을 안 나온 메이어씨도 직업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ㆍ교육상담사ㆍ목수ㆍ심리치료사 등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해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대 부설 국립사회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넉넉한 미소가 인상적인 토르벤 프리드버그 박사는 친절하게 질문에 응해 주었습니다. 저와의 인터뷰를 위해 ‘덴마크인은 왜 행복한가’라는 자료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설명한 행복의 열쇠는 신뢰였습니다.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ESS팀이 2003년 실시한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덴마크는 1위로 나왔습니다. 0~10점 척도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덴마크인이 6.99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6.18)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도(7.13) 또한 최고였습니다.
“시민끼리 서로 믿고, 또 국민은 정부와 제도를 믿고, 노(勞)와 사(使)가 서로 믿는 ‘신뢰의 선순환’이야말로 덴마크의 가장 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것이 프리드버그 박사의 설명입니다. ‘꿈’같은 이런 선순환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좀 길지만 프리드버그 박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덴마크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찾아야 할 것 같군요. 1848년 입헌민주주의가 도입된 이래 국왕은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특권을 내세우지 않았고,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그런 문화가 정치권과 기업계ㆍ언론계 등 아래로 스며들면서 사회 전체에 신뢰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또 이런 문화가 평등을 추구하는 덴마크의 전통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특권ㆍ부패ㆍ반칙ㆍ비리ㆍ기만이 통하지 않는 사회 풍토와 덴마크 식 복지 시스템으로 정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펜하겐의 유일한 한국식당인 비원에서 저녁을 먹다가 출장 나온 한국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덴마크 최대 기업인 A P 뮬러 앤 매스크의 한국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홍호택씨였습니다. 설계 전문 엔지니어 출신으로, 국내 조선업계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 덴마크 회사로 전직한 분입니다. 그분이 “행복한 덴마크인들과 일을 하는 나도 지금 행복하다”고 말해 한참 웃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어주니 행복하고, 쓸데없는 데 신경 안 쓰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한국인이 더 우수하지만 모여서 일을 해 보면 덴마크인이 더 낫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문은 서로 속이고, 의심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헐뜯는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군요. 덴마크 인구 540만 명에 비해 4800만 명이라는 우리 인구가 너무 많은 걸까요. 다음 주에는 ‘부패 없는 청정국가’ 핀란드에서 뵙겠습니다. 차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