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예술과 혁명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42) 도스토예프스키 시베리아 생활 10년
승인 2020-05-25 09:50:03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1849년 12월25일 성탄절 자정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족쇄가 채워진 채 두 마리의 말이 끄는 썰매 마차를 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눈 덮인 상트페데르부르크를 떠났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형 미하일과 작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징역살이 또한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는 것이겠지. …난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겠지.”
도스토예프스키는 노브로고드와 야로슬라블리를 거쳐 1850년 1월11일에 또볼리스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그는 데카브리스트 당원의 아내들을 만났다. 1825년 12월 14일 니콜라이 1세 즉위식에 데카브리스트 반란이 일어났다. 입헌군주제와 농노제 폐지를 주장한 청년장교들의 봉기는 실패로 끝나 이들은 처형당하거나 시베리아로 유배되었다.
폰 비진의 아내가 도스토예프스키에게 10루블 짜리 지폐가 표지에 숨겨진 성경 책을 몰래 건네주었다. 성경은 그가 옴스크 감옥에서 읽은 유일한 책이었다. 성경은 감옥 생활 4년 내내 그의 베개 밑에 있었다.
1월23일에 그는 옴스크 감옥에 도착했다. 시베리아 오지에 있는 감옥은 한 마디로 ‘죽음의 집’이었다. 다 쓰러져 가는 낡은 목조 건물은 여름엔 숨이 막힐 정도로 덥고 겨울엔 영하 40도로 추웠다. 빛이 거의 들지 않은 서리 자욱한 창문, 탄내 가득한 난로, 이와 벼룩, 오물, 욕설과 술주정 그리고 칼부림이 난무하는 곳이 옴스크 감옥이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2급 유형수로 4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그는 도둑이나 살인자 같은 죄수들과 같이 무거운 족쇄를 발에 달고 석고 연마하기, 기와 나르기 등 중노동을 하였다. 죄수들은 그를 귀족 대하듯이 적개심 어린 눈초리로 보았다. 그들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그를 적대했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4년 동안에 그를 둘러싸고 있던 밀수꾼, 화폐 위조자, 어린이 강간범, 부친 살해범, 강도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는 마주치기 어려운 인간상과 그들이 저지른 거의 모든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종교에 심취했다. 그는 신이 내린 시련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며 주어진 운명을 탓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죄수들에게서 사악함의 이면에 내재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에게 옴스크 감옥은 골고다 언덕과 같았다. 그는 감옥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였으며 수난자인 러시아 민중을 사랑하게 되었고, ‘신비주의적 인민주의’의 골격을 갖추게 된다.
(모출스끼 지음,이규환·이기주 옮김,러시아의 위대한 작가들, p.142-145)
한편 옴스크 감옥 생활이 세상에 알려지기엔 7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다. 그는 1860년 9월 '러시아 세계'지에 '죽음의 집의 기록' 서론을 싣고, 1861년 1월에 같은 잡지에 제1부를 게재했으며, 1862년에 '시대' 지에 제2부를 게재했다.
소설의 서론엔 화자가 나온다. 화자는 시베리아 여행 도중에 죄수였던 고랸치코프를 알게 되었다. 그는 아내를 살해하여 10년의 죄수 생활을 마치고 쿠즈네츠크에서 살고 있었다. 고랸치코프가 죽고 나서 화자는 그의 노트를 입수하게 된다. 노트는 ‘죽음의 집의 광경’이란 제목으로 기록된 수기였다. 화자는 수기에 매력을 느껴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소설은 고랸치코프의 수형생활이 자세히 묘사한다.
'죽음의 집의 기록'은 공동체험에 무감각하고 냉담한 러시아인들을 흔들어 깨웠다. 알렉산드르 2세도 이 책을 읽으며 흐느꼈다 한다. (츠바이크 지음 · 원당희 옮김, 도스토옙스키를 쓰다, 세창미디어, 2013, p39)
투르게네프는 ‘단테적 묘사’라고 갈채하였고, 톨스토이도 최고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도스토예프스키는 1854년 2월에 출옥 후 사병 신분으로 중앙아시아 세미팔라틴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대대에서 근무했다.
이 때 그는 이사예바 부부를 알게 되었는데 서른 살이 넘은 부인 마리야 이사예바는 주정뱅이 남편 때문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 도스토예프스키는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1855년 8월에 남편이 죽자 그는 아들이 딸린 그녀에게 청혼하였다. 하지만 마리야는 일개 사병에 불과한 그의 청혼을 10개월이나 미루다가, 결국은 24세의 미남교사 베르구노프를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내 도스토예프스키를 절망에 빠뜨렸다.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가 1856년 10월에 장교로 승진하자 마리야의 태도가 달라져 11월에 청혼을 숭락하였고, 두 사람은 1857년 2월에 쿠즈네츠크에서 결혼했다.

장교 복장의 도스토예프스키. 사진=김세곤 제공
그런데 이들의 결혼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신랑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발작을 일으켰고, 신부는 폐병이 갈수록 심해져 히스테리와 우울증이 늘어났다. 결혼생활은 고달팠고 전 남편 아들의 양육도 부담이었다.(홍대화 지음, 도스또예프스키 읽기의 즐거움, 살림출판사, 2005, P 4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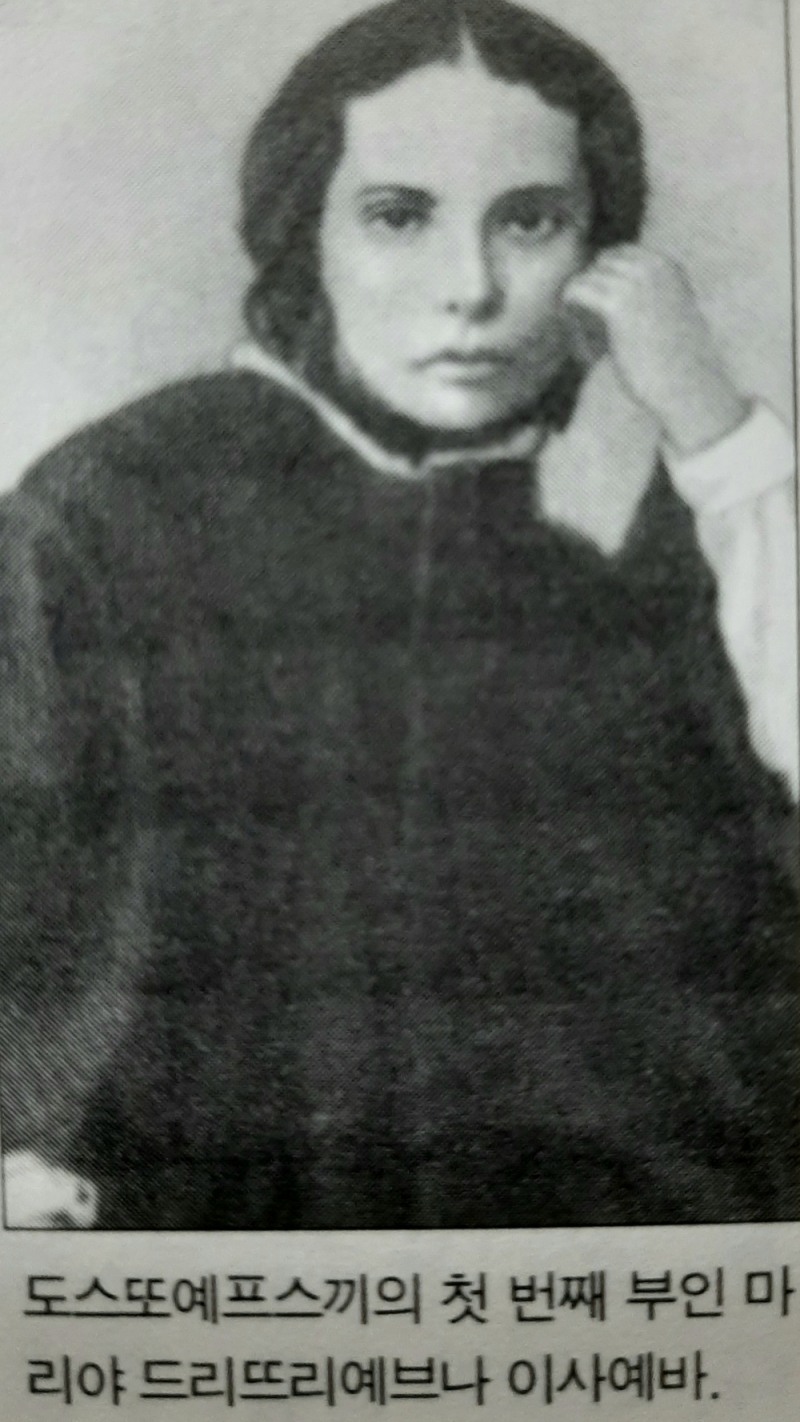
도스토예프키의 첫 아내 마리야 이사예바 초상화. 사진=김세곤 제공
1859년 11월에 알렉산드르 2세는 그에게 페테르부르크 거주 허가를 내주었다. 마침내 그는 12월에 아내와 전 남편 아들과 함께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다. 10년 만의 귀환이었다.
여행칼럼니스트/호남역사연구원장
<저작권자 © 글로벌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내와 세계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예술과 혁명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43) 도스토예프스키, 불행한 결혼과 연애 (0) | 2020.06.02 |
|---|---|
| '프라하의 봄' (0) | 2020.06.01 |
| 프라하의 얀 후스 동상 (0) | 2020.05.24 |
| [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예술과 혁명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41) 도스토예프스키, 페트라셰프스키 사건에 연루되다. (0) | 2020.05.19 |
| [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예술과 혁명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40) 도스토예프스키, 처녀작 '가난한 사람들'로 대박나다. (0) | 2020.05.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