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세계여행
[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예술과 혁명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37) 고골의 '코'와 '외투'
김세곤
2020. 4. 20. 13:15
[김세곤의 세계문화기행] 예술과 혁명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37) 고골의 '코'와 '외투'
승인 2020-04-20 07:40:31

줄거리를 살펴보자.
“흔히 볼 수 없는 괴상한 사건이 3월25일 뻬쩨르부르크에서 발생했다. 이발사 이반은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다가 빵 속에 코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 코를 다리 주변에서 몰래 버리려다 경찰에게 들킨다. 여기서 이야기는 갑자기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한편, 8급 관리 코발료프 소령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다가 자기의 코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승진 청탁을 위해 일시 페테르부르크에 온 장교였다. 당황한 그는 진상 파악을 위해 경찰국장을 만나러 가다가 우연히 자기보다 3계급 높은 5급 관리(준장) 행세를 하는 자기 코를 보게 된다. 코는 거만스럽게 시내를 활보하면서 사람들의 진귀한 구경거리가 된다. 그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그러다가 4월7일에 갑자기 그의 코가 거짓말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코는 일종의 변신 이야기이다. 카프카의 변신 (1916년 작품)보다 100여 년 앞섰다. 한편 고골은 책 제목에 신경을 쓰는 작가였다. 이 소설의 첫 제목은 ‘코(러시아어로 Nos)’가 아닌 ‘꿈(Son)’이었다. 소설은 꼬발료프 소령의 꿈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런데 고골은 소설 제목을 ‘꿈(Son)’ 단어를 거꾸로 한 코(Nos)로 바꾸었는데, 5급 관리 코의 위상이 부각되었다.
또한 코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다. 소설의 시작일자는 3월25일인데 코가 돌아온 날자는 4월7일이다. 고골은 교묘하게 러시아 구력과 유럽 그레고리력을 섞었다. 러시아 구력 3월25일은 유럽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면 4월 6일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하루 동안 일어난 꿈 이야기다. (고골 지음 조주환 옮김, 뻬쩨르부르크 이야기, 민음사, 2005)
한편 고골은 1842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외투'를 발표했다. 외투는 천신만고 끝에 외투를 마련한 가난한 하급 관리 이야기이다. 이름도 이상한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는 공문서를 정서하는 9등 문관으로, 승진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쉰 살이 넘도록 정서 업무에만 만족하며 살아왔다. 어느 초겨울, 오랫동안 입은 낡은 외투를 수선하러 간 아까끼에게 재봉사 페트로비치는 더 이상 수선이 불가능하니 새 외투를 장만하라고 조언한다.
아까끼는 먹고 입는 것을 아끼고 또 아껴 6개월 만에 새 외투를 장만한다. 드디어 그는 새 외투를 입고 출근한다. 동료들은 그를 축하하고 부과장은 축하파티까지 열어준다. 그런데 그날 밤 축하파티에서 돌아오면서 그는 강도들에게 외투를 빼앗긴다.
다음 날 아까끼는 경찰서장을 찾아갔다. 그런데 어렵게 만난 경찰서장은 그에게 왜 한밤중에 다녔느냐고 핀잔을 준다. 동료직원이 고위관리를 찾아가라고 조언해주자, 아까끼는 고위관리를 찾아간다. 고향친구와 담소를 하고 있던 고위관리는 아까끼에게 고압적으로 호통만 치고 신경질만 낸다. 이후 아까끼는 너무 상심한 나머지 하숙집에서 앓다가 숨을 거두고 만다.
얼마 후 페테르부르크 시내에 외투를 빼앗아가는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떠돈다. 어느 날 밤 아까끼에게 호통을 쳤던 고위관리 앞에 유령이 나타났다.
“으! 이제야 네 놈을 만났구나! 드디어 네놈을 잡았어! 난 네놈의 외투가 필요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야단을 치다니, 네 옷을 당장 내놔!”
이러자 고위관리는 공포에 질려서 고급 외투를 벗어 던지고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돌아온다. 이날 이후 고위관리의 호통이 현저히 줄었다. 더 주목할 일은 고위관리의 외투가 유령에게 꼭 맞았는지, 유령이 나타나 외투를 빼앗았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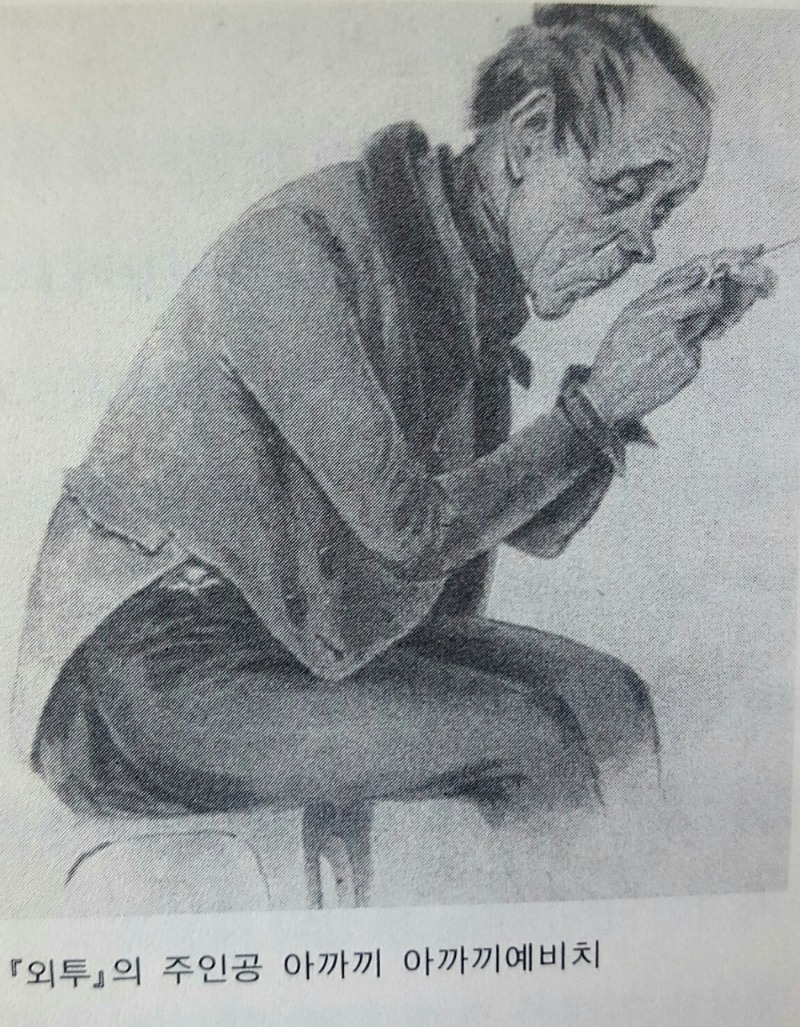
'외투'의 주인공 아까끼 아까끼예비치. 사진=김세곤 제공
외투를 읽다 보면 씁쓸한 웃음이 나온다. ‘눈물이 가려진 웃음’ 같은 것이다. 이렇게 고골의 소설은 슬픔 뒤의 웃음이 서려 있다.
외투는 러시아 문학상 가장 영향력 있는 단편소설이 되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즉 모욕받고 상처 입은 소시민 ‘작은 인간’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출발점을 '외투'에서 찾고 있다.
푸시킨이 시를 통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러시아 근대문학의 전통을 확립했다면, 고골은 소설을 통해 비판적 리얼리즘의 기반을 쌓았다. 평론가 벨린스키는 1840년대 이후를 '고골의 시대'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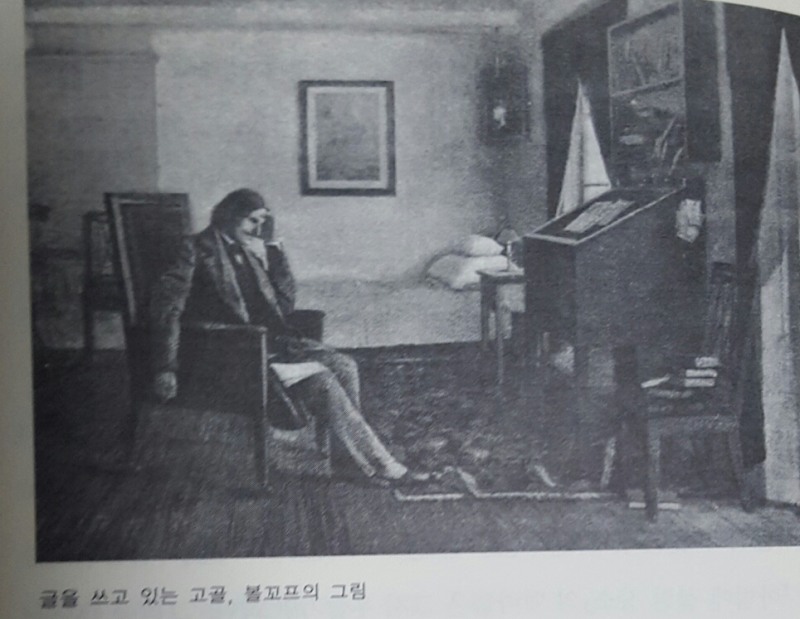
여행칼럼니스트/호남역사연구원장